
*본 게시물은 ‘K-문학과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가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한 칼럼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해외에서 한국 문학의 성취는 눈부셨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2016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수상한 것을 필두로, 2018년 편혜영 작가의 <홀>이 셜리 잭슨 상을, 2021년 윤고은 작가의 <밤의 여행자들>이 대거상 번역 추리소설상을, 2022년에는 손원평 작가의 <서른의 반격>이 일본서점대상을, 같은 해 김소연 시인의 <한 글자 사전>이 일본번역대상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끼>와 천명관 작가의 <고래>가 최종 후보(숏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중국 은하상 최고인기 외국작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물론 문학상만이 문학이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성취는 아니겠지만, 우리 문학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는 충분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K-팝이나 K-드라마, K-무비라는 말을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K-문학이라는 말 역시 가능할까? BTS와 <오징어게임>, 혹은 <기생충>처럼, K-문학의 시대는 과연 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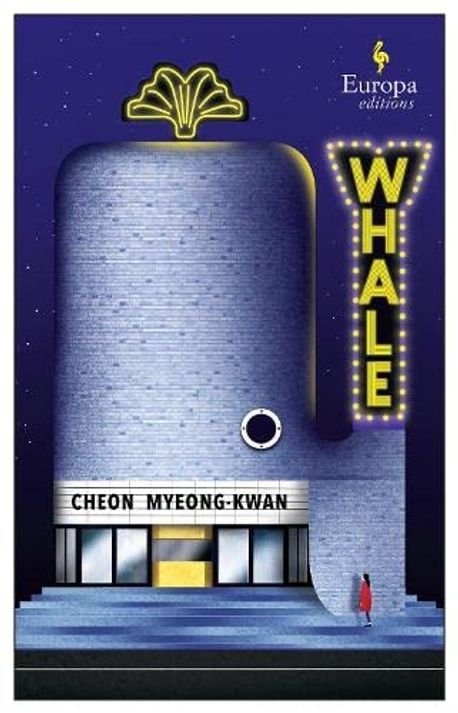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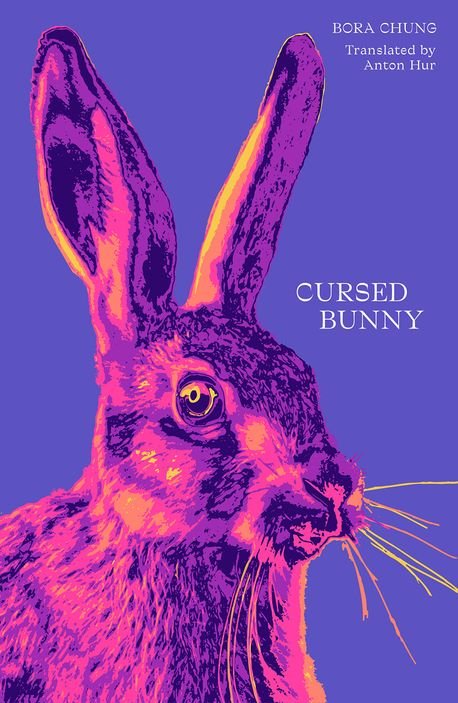
<고래>,<저주토끼> 번역판 표지 (출처=교보문고)
그동안 한국 문학이 세계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두 가지로 들었다. 하나는 한국어가 너무 뛰어나고 섬세한 언어이기 때문에, 도무지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랗다’와 ‘노르스름하다’를 어떻게 구분한단 말인가? 찰진 방언과 우리 고유의 정서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뭉뚱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생각에는 우리 말과 우리 문화만이 고유하고 특별하다는 착각과 오만이 동시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지지하기 어렵다. 모든 문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유하며, 번역이라는 필터를 거치는 것은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입장은 한국 문학이 실제로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문학, 특히 그중에서도 소설은 근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근대화를 늦게 시작한 우리로서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소설의 역사가 짧고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논리에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지만,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일궈온 근대화는 이제 서구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같은 논리에 문학을 넣어보면, 문학이라고 해서 다를까? 나는 이미 한국 문학이 (최대한 양보하여) 적어도 단편소설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만드는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작가들의 예술적 기예도 여기까지 온 것이다.
위 두 입장은 완전히 상반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자기 미화’와 ‘자기 비하’의 공통점은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한국 문학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문제는 단 하나. 우리가 읽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문학이 세계로 보다 더 발돋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독자의 존재다. 누군가 읽어주지 않는다면 작가와 작품은 존재 가치를 잃는다. 자국에서도 읽히지 않는 책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이 가능할까? 외국 에이전시들은 판권을 사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 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묻는다. 책을 사고, 읽고, 이야기하는 독서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속 K-문학의 선전을 기대하는 것은 비인기종목의 금메달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문학의 독자가 줄어들수록 한국 문학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출판과 번역의 문제다. 문단문학과 장르문학을 불문하고 뛰어난 작가는 한국에 이미 많다. 다만 우리를 포함한 세계가 알지 못할 뿐이다. 아직 널리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리는 것이 시장과 출판사의 일이라면, 국가와 정부는 다양한 출판 및 번역 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도서 판매유통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정한 계약서의 바탕을 제공하며, 출판계의 뿌리 깊은 악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작가와 번역가, 편집자와 같은 출판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 왜 이것을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냐고? 이보다 더 ‘공공’의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학은 결국 한 나라의 언어와 정신, 내면과 문화에 관한 기록이다. 한국어로 쓰인 문학이 사라지면 우리의 내면은 다른 언어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모더니즘의 거장 제임스 조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더블린에 관해 쓴다. 더블린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도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것 속에 보편적인 것이 담겨 있다.” 이를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구호를 외치는 데 있지 않다. 저절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어, 우리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목소리로 번역하며,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K-문학의 시대는 도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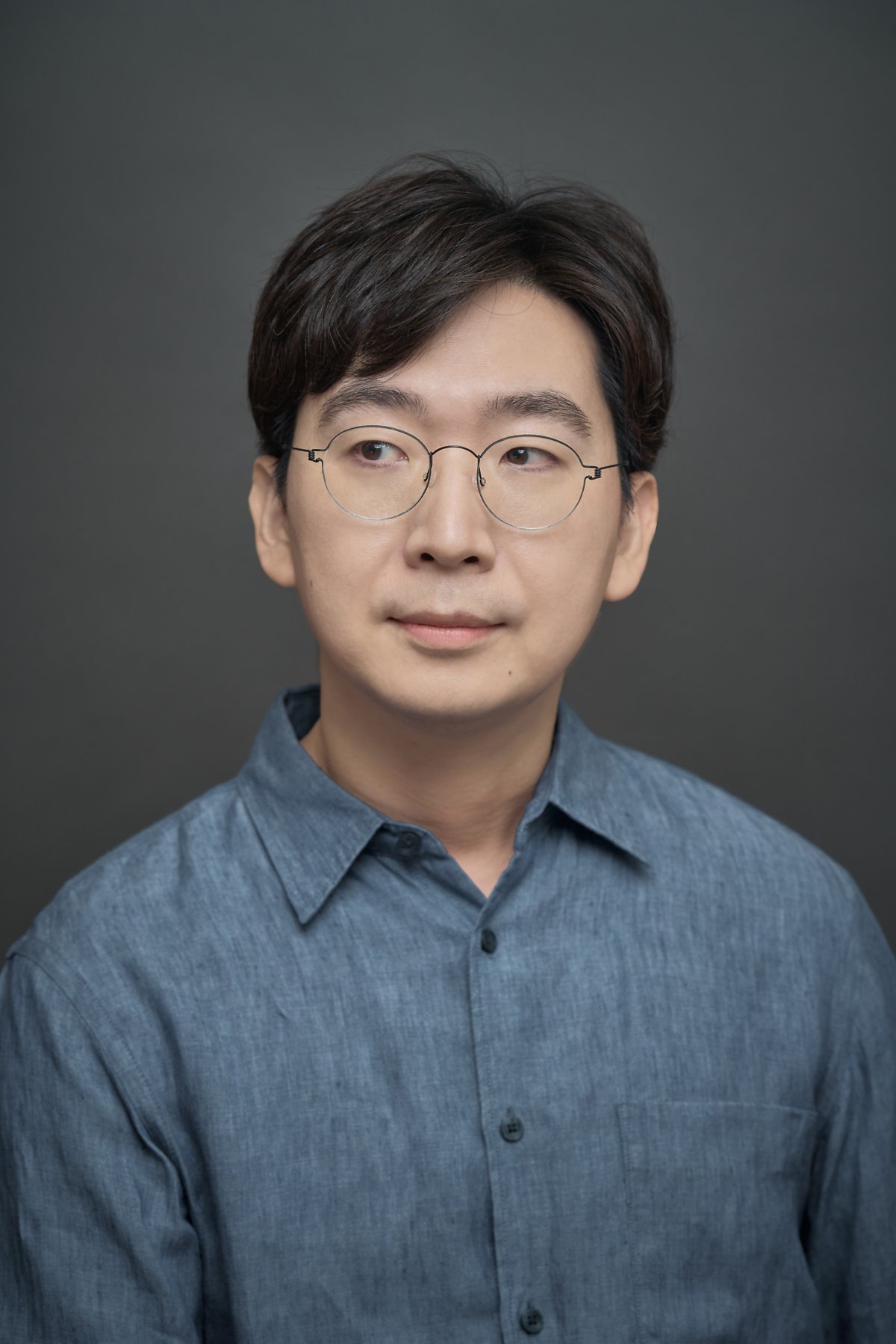
문지혁
2010년 단편소설 「체이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중급 한국어』 『초급 한국어』 『비블리온』 『P의 도시』 『체이서』, 소설집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사자와의 이틀 밤』 등을 썼고 『라이팅 픽션』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 등을 번역했다. 대학에서 글쓰기와 소설 창작을 가르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